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김수영, 「거미」 『김수영전집-시』
1.
시인 김수영(金洙暎, 1921-1968)은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했나 봅니다. 부인이 경제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싫어도 별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산문을 보면 물걸레질을 할 때 부인의 머리카락이 장판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날도 아마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청소를 하면서 시인이 얼마나 자괴감을 갖게 되었을지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바닥 청소라는 것이 으레 그렇지만 무척 허리가 아픈 일입니다. 시인도 아마 허리가 아팠나 봅니다. 청소를 잠시 멈추고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천장 구석 후미진 곳에 거미줄이 하나 쳐 있는 겁니다. 때는 가을이라 당연히 거미줄에 걸릴 곤충도 없을 겁니다. 여름이라면 파리나 모기 등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을이거든요. 그러니 거미줄을 지키는 거미는 까맣게 말라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심결 보았던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거미줄과 그것을 지키느라 말라가는 거미는 점점 시인의 내면에 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침내 시인은 말라가는 거미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예리하게 통찰해냅니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러운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날을 남편은 기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남편은 일찍 귀가할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둘이서 일구어간 삶과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낮에 그녀가 근사한 와인과 초를 준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마침내 11시가 되어도 남편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는 연락도 없는 겁니다.
그녀는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와인 한 병, 근사한 잔 두 개, 그리고 아직 켜지 않은 예쁜 초 한 자루가 덩그러니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풍경이 그녀를 더 서럽게 만듭니다. 지금 그녀는 천장 한켠에 거미줄을 치고 오지 않는 곤충을 기다리다가 말라가는 거미와 같습니다. 분명 그녀가 바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서러움의 강도는 클 것입니다.
그녀가 서러움을 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더 이상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바라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러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험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서러움도 없게 될 겁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가 별다른 다툼도 없이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이유가 짐작이 되나요?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바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서러움도 없어지지만 동시에 기쁨과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과는 달리 남편이 7시에 일찍 귀가하였다면 그녀는 무척 기뻤을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엇인가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서러움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의 뿌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너무나 서러워서 바라는 것을 죽여 나갔고 마침내 더 이상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릴 행복도 교살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서럽다고 해서 바라는 것을 죽였을 때 행복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당신은 바라는 것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인간이라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러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삶, 이것은 돌멩이와 같은 무생물의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살아있지만 사는 것도 아닌 기묘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결코 없을 겁니다.
2.
서러움이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란다는 것의 정체를 숙고해야만 합니다. 바란다는 것을 숙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인류의 수많은 지성들이 속앓이를 아끼지 않았던 욕망이란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현대철학의 흐름을 흔히 욕망을 긍정하는 데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철학이 대부분 욕망을 부정하는, 혹은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대립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 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욕(禁欲), 절욕(節欲), 무욕(無欲) 혹은 과욕(寡欲)과도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욕망을 부정하는 과거 사유 전통에도 은밀하게 욕망을 긍정하는 논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을 줄이면 서러움이 적어지지만, 동시에 작은 행복은 쉽게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금욕주의적인 주장의 이면에는 일종의 신포도 전략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자신이 먹을 수 없으니까 포도가 시어서 먹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 위로였던 것이지요.
보통 욕망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욕망, 식욕이나 성욕 등을 연상합니다. 분명 식욕이나 성욕도 욕망,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종 일반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식욕이나 성욕은 나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여지만을 남겨주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욕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만의 욕망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욕망이니까 말입니다. 육체와 관련된 욕망은 나만의 욕망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만의 단독성(singularity)에 따라 식욕과 성욕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나라는 사람만의 색깔을 띠지 않는 육체적 욕망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맹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은 과거와 주로 관련된 욕망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의 대상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적 욕망 이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ideal)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의 힘으로 현재를 지배하는 육체적 욕망과는 달리 이상을 바라는 욕망은 미래의 힘으로 현재를 지배합니다. 결국 육체적 욕망이 과거적 욕망이라면, 이상에 대한 욕망은 미래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래해야만 할 가치가 있다고 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이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수영의 경우 개인들이 공통된 중심이 아니라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바랬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인이 행복했던 것도, 혹은 곧 이어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시인은 서러웠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이상이 반드시 사회적인 색깔만 띨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받는 삶도 그릴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상은 항상 옳은 것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인자, 독재자, 배신자 등등을 이상으로 삼는 경우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문제는 이상을 이상으로 끌고 가는 삶,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관철하려는 삶이 무척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상을 지키려는 삶을 자본, 권력, 관습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간혹 좌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현실의 급류에 몸을 맡기게 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라고요. 그렇지만 이상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저 현재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시체와 같은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3.
연애편지는 언제 쓰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간절히 내밀지만 무심한 상대방은 아직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애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연애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경우 우리는 연애편지를 마치 일기처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치지도 못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글쓰기, 혹은 문학의 기원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 그렇지만 결코 바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글은 하나의 서러움이자 절망의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결코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러움이 찾아들 때, 우리는 글을 씁니다. 김수영은 너무나 바라는 것이 많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러움도 많았겠지요.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친구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김수영은 너무나 다채로운 시를 많이도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삶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러울 수밖에요.
한 편 한 편 그의 주옥같은 시는 바로 이런 서러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김수영을 읽는다는 것은 그의 서러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서러움을 가능하게 했던 그가 바랐던 것을 읽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모든 글들은 서러운 절망의 표현이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의 비밀을, 혹은 모든 문학의 비밀을 우리는 마침내 찾은 셈입니다.
문학만이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을 포함한 모든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를 아시나요. 그는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그의 인간론과 교육론이 가장 잘 전개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에밀(Emile ou De I'education)』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신랄한 비평가들은 루소가 어떻게 인간과 교육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지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의 글을 읽을 가치가 없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루소를 보아야 할까요? 과연 그는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고아원에 자식들을 맡기고 그곳을 떠나는 루소의 서러움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이나 자식들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소는 서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자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에밀』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주변에 글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가볍게 물어보곤 합니다. “사는 것이 서럽습니까?”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글을 쓰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서러움을 낳을 정도로 바라는 것이 없다면, 글은 제대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포즈로서의 글쓰기입니다.
그렇지만 김수영, 카프카, 그리고 루소가 과연 포즈로서의 글쓰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치지도 못할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연애를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연애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좋은 글은 서러운 비명이지만 동시에 바라는 것을 놓지 않겠다는 간절한 다짐 속에서만 쓰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글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yes24.com/chyes/ChyesColumnView.aspx?title=005045&cont=5989
강신주의 이토록 새로운 삶
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김수영, 「거미」 『김수영전집-시』
1.
 |
 |
그날도 아마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청소를 하면서 시인이 얼마나 자괴감을 갖게 되었을지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바닥 청소라는 것이 으레 그렇지만 무척 허리가 아픈 일입니다. 시인도 아마 허리가 아팠나 봅니다. 청소를 잠시 멈추고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천장 구석 후미진 곳에 거미줄이 하나 쳐 있는 겁니다. 때는 가을이라 당연히 거미줄에 걸릴 곤충도 없을 겁니다. 여름이라면 파리나 모기 등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을이거든요. 그러니 거미줄을 지키는 거미는 까맣게 말라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심결 보았던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거미줄과 그것을 지키느라 말라가는 거미는 점점 시인의 내면에 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침내 시인은 말라가는 거미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예리하게 통찰해냅니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러운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날을 남편은 기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남편은 일찍 귀가할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둘이서 일구어간 삶과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낮에 그녀가 근사한 와인과 초를 준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마침내 11시가 되어도 남편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는 연락도 없는 겁니다.
그녀는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와인 한 병, 근사한 잔 두 개, 그리고 아직 켜지 않은 예쁜 초 한 자루가 덩그러니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풍경이 그녀를 더 서럽게 만듭니다. 지금 그녀는 천장 한켠에 거미줄을 치고 오지 않는 곤충을 기다리다가 말라가는 거미와 같습니다. 분명 그녀가 바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서러움의 강도는 클 것입니다.
그녀가 서러움을 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더 이상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바라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러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험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서러움도 없게 될 겁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가 별다른 다툼도 없이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이유가 짐작이 되나요?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바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서러움도 없어지지만 동시에 기쁨과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과는 달리 남편이 7시에 일찍 귀가하였다면 그녀는 무척 기뻤을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엇인가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서러움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의 뿌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너무나 서러워서 바라는 것을 죽여 나갔고 마침내 더 이상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릴 행복도 교살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서럽다고 해서 바라는 것을 죽였을 때 행복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당신은 바라는 것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인간이라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러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삶, 이것은 돌멩이와 같은 무생물의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살아있지만 사는 것도 아닌 기묘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결코 없을 겁니다.
2.
서러움이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란다는 것의 정체를 숙고해야만 합니다. 바란다는 것을 숙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인류의 수많은 지성들이 속앓이를 아끼지 않았던 욕망이란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현대철학의 흐름을 흔히 욕망을 긍정하는 데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철학이 대부분 욕망을 부정하는, 혹은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대립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 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욕(禁欲), 절욕(節欲), 무욕(無欲) 혹은 과욕(寡欲)과도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욕망을 부정하는 과거 사유 전통에도 은밀하게 욕망을 긍정하는 논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을 줄이면 서러움이 적어지지만, 동시에 작은 행복은 쉽게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금욕주의적인 주장의 이면에는 일종의 신포도 전략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자신이 먹을 수 없으니까 포도가 시어서 먹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 위로였던 것이지요.
보통 욕망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욕망, 식욕이나 성욕 등을 연상합니다. 분명 식욕이나 성욕도 욕망,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종 일반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식욕이나 성욕은 나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여지만을 남겨주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욕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만의 욕망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욕망이니까 말입니다. 육체와 관련된 욕망은 나만의 욕망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만의 단독성(singularity)에 따라 식욕과 성욕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나라는 사람만의 색깔을 띠지 않는 육체적 욕망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맹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은 과거와 주로 관련된 욕망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의 대상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적 욕망 이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ideal)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의 힘으로 현재를 지배하는 육체적 욕망과는 달리 이상을 바라는 욕망은 미래의 힘으로 현재를 지배합니다. 결국 육체적 욕망이 과거적 욕망이라면, 이상에 대한 욕망은 미래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래해야만 할 가치가 있다고 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이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수영의 경우 개인들이 공통된 중심이 아니라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바랬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인이 행복했던 것도, 혹은 곧 이어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시인은 서러웠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이상이 반드시 사회적인 색깔만 띨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받는 삶도 그릴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상은 항상 옳은 것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인자, 독재자, 배신자 등등을 이상으로 삼는 경우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문제는 이상을 이상으로 끌고 가는 삶,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관철하려는 삶이 무척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상을 지키려는 삶을 자본, 권력, 관습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간혹 좌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현실의 급류에 몸을 맡기게 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라고요. 그렇지만 이상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저 현재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시체와 같은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3.
연애편지는 언제 쓰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간절히 내밀지만 무심한 상대방은 아직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애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연애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경우 우리는 연애편지를 마치 일기처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치지도 못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글쓰기, 혹은 문학의 기원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 그렇지만 결코 바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글은 하나의 서러움이자 절망의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결코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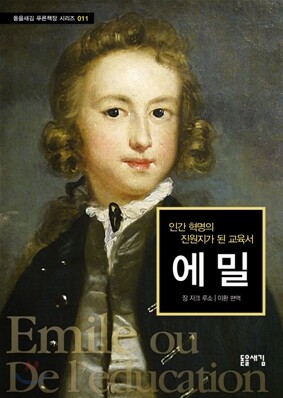 |
 |
한 편 한 편 그의 주옥같은 시는 바로 이런 서러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김수영을 읽는다는 것은 그의 서러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서러움을 가능하게 했던 그가 바랐던 것을 읽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모든 글들은 서러운 절망의 표현이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의 비밀을, 혹은 모든 문학의 비밀을 우리는 마침내 찾은 셈입니다.
문학만이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을 포함한 모든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를 아시나요. 그는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그의 인간론과 교육론이 가장 잘 전개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에밀(Emile ou De I'education)』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신랄한 비평가들은 루소가 어떻게 인간과 교육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지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의 글을 읽을 가치가 없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루소를 보아야 할까요? 과연 그는 자식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고아원에 자식들을 맡기고 그곳을 떠나는 루소의 서러움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이나 자식들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소는 서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자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에밀』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주변에 글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가볍게 물어보곤 합니다. “사는 것이 서럽습니까?”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글을 쓰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서러움을 낳을 정도로 바라는 것이 없다면, 글은 제대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포즈로서의 글쓰기입니다.
그렇지만 김수영, 카프카, 그리고 루소가 과연 포즈로서의 글쓰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치지도 못할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연애를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연애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좋은 글은 서러운 비명이지만 동시에 바라는 것을 놓지 않겠다는 간절한 다짐 속에서만 쓰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글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yes24.com/chyes/ChyesColumnView.aspx?title=005045&cont=5989
강신주의 이토록 새로운 삶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톨레랑스, 유럽의 새빨간 거짓말 - 박노자 (0) | 2011.06.13 |
|---|---|
| 정혜윤, 고전 연재를 마치며, 동시에 시작하며 /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는? / 별일 없이도 기분 좋아지고 싶은 날 (1) | 2011.06.08 |
|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통속적이다 by 아키 (2) | 2011.05.31 |
| 공포로 유지되는 사회, 민주주의가 질식한 민주주의 사회 (0) | 2011.05.31 |
|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0) | 2011.05.31 |
| 보르헤스 (0) | 2011.05.31 |
| 소셜네트워크(ted) (0) | 2011.05.15 |
| 공공사업(ted) (0) | 2011.05.15 |
| 파스칼키냐르, 옛날에 대하여 (0) | 2011.05.10 |
| 사랑과 연합 (0) | 201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