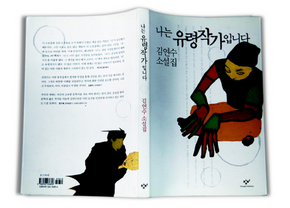순진한 믿음과 성급한 체념의 사이
|
||||||
‘설산’의 후반부는 이 불가능성에 딸려 나오는 어떤 윤리적 행위의 장면화에 바쳐진다. 남자는 시커멓게 뚫린 구멍을 메우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나가다가 도서관에서 <왕오천축국전>의 주석서를 발견한다. 투신하기 며칠 전 그녀가 대출해서 여기저기 밑줄을 쳐가며 읽은 책. 남자는 맹렬한 책읽기를 멈추고 여자친구와 자신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소설을 썼지만 역시 여자친구를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는 급기야 여자가 읽은 혜초의 기록을 좇아 자살하는 심정으로 낭가파르바트에 올랐고, 그곳에서 죽었다. 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행위가 필사적일수록, 이해 불가능성은 더 확실해지고 또 절망적으로 돼간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현실 자체라고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늘 이해 불가능한 어떤 지점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가능성 앞에서 성급하게 좌절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순진한 믿음과 성급한 체념, 정확히 그 둘 사이에 ‘삶’은 있다. 불가능한 이해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으며 저 구멍 뚫린 대상에 필사적으로 주석 달기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우리 ‘삶’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오로지 그때만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설산’을 지탱하는 것은, 인식론과 존재론, 윤리학의 근방을 차례로 더듬는 뼈아픈 성찰이며, ‘설산’을 읽는 우리가 체험하는 강렬한 울림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은밀한 주석 달기의 유혹
거기서 ‘설산’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남자는 여자친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이해와 몰이해가 만나는 지점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며 무수한 문장들을 썼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 읽은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라면, <왕오천축국전>의 주석가이자 남자의 소설을 받아보고 뒤에 남자와 사랑에 빠진 H가 다시 필사적으로 주석을 달고 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설산’이 통째로 H의 주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한 몸으로 24살의 청년을 사랑한 여교수의 내면 앞에서, 자신을 남겨두고 다른 여자를 떠올리며 낭가파르바트에서 죽음을 맞이한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남자의 죽음에 주석을 달고 있는 H의 구멍 뚫린 내면 앞에서, 독자들은 다시 은밀한 주석 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설산’의 주석 달기는 1990년대적 내면성 우위의 소설들이 종종 빠져들곤 했던 나르시시즘의 함정에서 우아하게 빠져나가며 타자와의 불가능한 만남을 향한 강렬한 제스처를 완성한다. 주석 달기란 언제나 타자의 삶을 향해 방향지어지는 것. 수많은 주석이 서로를 향해 복잡하게 엉켜들며 김연수 소설의 거대한 성좌를 만들어낸다. 간절하게 빛나는 저 성좌 앞에서 가슴 시리지 않을 이치가 없다.
권희철 문학평론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은밀한 생 (네미) (0) | 2011.03.26 |
|---|---|
|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 (0) | 2011.03.26 |
| 은밀한 생 (아트라니) (0) | 2011.03.26 |
| 소년이여 (0) | 2011.03.20 |
| 루쉰을 읽는다 (0) | 2011.02.21 |
| 김수영 혹은 박인환, 어떤 오독 (0) | 2011.02.14 |
| 맹물, 보고싶은 얼굴 (2) | 2011.02.11 |
| 현대예술의 철학 3,4 고전적 모더니즘 / 5 미국의 모더니즘 (0) | 2011.02.09 |
| 파스칼 키냐르, 로마의 테라스 (0) | 2011.02.08 |
| 데리다 이후의 데리다 / 메를로 뽕띠와 데리다: 표현과 의미의 현상학적 연구 (0) | 2011.02.07 |